돌부처가 또 이상한 돌을 던졌다
백종인 입력 2018.05.11. 08:05 수정 2018.05.11. 08:12

2016년의 일이다. 그러니까 파이널 보스가 세인트루이스에서 한참 잘 나갈 때다. 클럽하우스에서 한국 보도진과 환담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방해꾼이 나타났다. 불펜의 수하였던 맷 보우먼이었다.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더니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리곤 제법 간절한 눈빛으로 가르침을 청했다. “보스의 슬라이더를 배우고 싶습니다.”
자비로운 불심이 마다할 리 있나. 엄지와 검지, 중지의 사용법을 설파했다. 그러나 공짜는 없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는 법. 반대급부를 요구했다. “이번에는 네가 잘 던지는 투심에 대해서 설명해 보거라.”
보우먼은 자신의 비기에 대해서 속속들이 털어놔야 했다. 공 잡는 법부터, 손가락으로 채는 힘의 배분을 어떻게 하는 지, 실밥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 기타 등등에 대한 시시콜콜한 문답이 오갔다.
이 대목에서 의문이 생긴다. ‘톱 클래스 투수가 투심 던지는 법도 몰라서 물어보나’ 하는 점이다. 대답은 물론 ‘NO’다. 유튜브에도 다 있는 걸 모를 리 있나. 그의 투심에 대한 탐구는 훨씬 오랜 역사를 가졌다. 아마도 선수 생활을 시작한 이래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그럼에도 여전히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숙원 사업일 지 모른다. 바로 오늘 <…구라다>가 하려는 얘기다.

공 7개 칼퇴근…2개의 인상적인 투심
어제(한국시간 10일) 경기는 실망이었다. 승진 발령을 잔뜩 기대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근 시간은 여전히 지고 있는 (스코어 1-2) 6회였다.
오기가 작동한 것일까. 조기 출근을 칼 퇴근으로 되갚았다. 달랑 7개만 던지고 할당량을 완수한 것이다. ‘먼저 갑니다. 다들 수고하세요.’ 불과 5분만에 업무용 데스크 탑은 절전 모드에 들어갔다. 작업 끝~.
복잡할 것도 없다. 7개 모두 패스트볼로 끝냈다. 3명의 타자를 플라이볼-삼진-땅볼로 돌려세웠다. 하지만 7개 모두가 똑같은 패스트볼이라고 보면 큰 오해다. 각각의 이름들이 다르다. 총 3가지가 이용됐다. 포심, 커터,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투심이다.
풀네임은 투심(two seam 혹은 two seamed) 패스트볼이다. LA의 99번 투수가 금세 습득해서 던진다고 ‘야구 천재’ 소리를 듣던 그 공 말이다. 중간 보스는 이날 2개의 투심을 투척했다. 두번째 타자(마이크 주니뇨)의 2구째, 그리고 세번째 타자(기예르모 에레디아)에게 던진 초구였다.
주니뇨에게 던진 것은 볼이 됐다. 90.4마일짜리가 타자 몸쪽으로 너무 꺾였다. 존을 한참 비껴났지만, 그만큼 확연한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휘어짐이 상당했다. ‘세상에 저런 공도 던질 줄 알았나?’ 눈을 비빌만큼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효과를 제대로 나타낸 것은 그 다음에 나왔다. 퇴근을 알린 7구째였다. 역시 우타자인 에레디아를 맞은 초구였다. 마찬가지로 몸쪽에 파고들었다. 빗맞은 타구는 힘없는 땅볼이 됐다. 3루수의 놀라운 수비가 로저스 센터를 열광시켰다. 주전 포수면서 3루까지 투 잡을 뛰는 러셀 마틴의 작품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플로리다에 있는 명문 치폴라 컬리지(호세 바티스타와 동창) 때까지 유격수로 활약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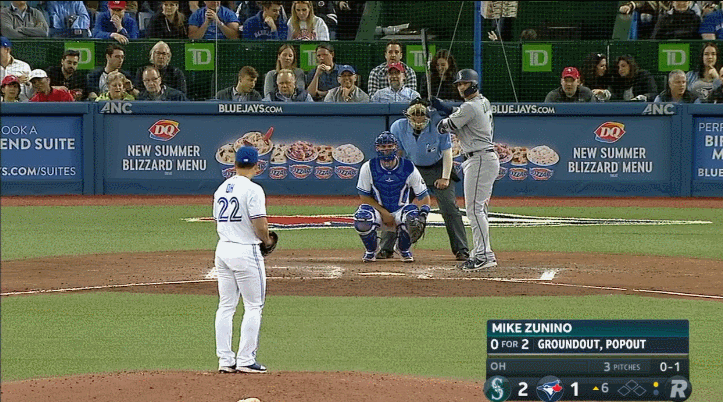
스프링캠프 때만 한정 유통되던 단어 ‘투심’
투심에게는 몇몇 이웃 사촌들이 존재한다. 피붙이 쌍둥이와 다름 없는 게 싱커(싱킹 패스트볼)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투심과 싱커가 거의 같은 공으로 통칭되고 있다. (관련기사 = 까불지마, 류현진의 투심에 담긴 뜻, http://v.sports.media.daum.net/v/20180223085407513?mccid=353)
약간 휘어지면서 살짝 떨어지는 성질을 가졌다. 물론 실밥을 어떻게 걸고, 손 끝에서 어떤 채임을 만드는 지에 따라 변화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리고 또 하나, 사촌 형제 쯤 되는 게 스플리터다. 투심에서 손가락을 조금 넓게 벌려 잡는다. 폭이 좁으면 투심과 가깝고, 넓게 벌리면 포크볼이 되는 셈이다. 과거 대마신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일본의 마무리 투수 사사키 가즈히로는 3종류의 스플리터를 던진 것으로 유명했다. 손가락 벌림의 정도로 낙차와 스피드를 조절한 것이다.
보스의 투심은 스플리터와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 우타자의 몸쪽으로 (역회전) 휘어지면서 살짝 가라앉는다.


문제는 히스토리다. 그는 과연 언제부터 투심과 친해졌을까.
대략 2011년 이후로 보면 될 것 같다. 거칠 것 없던 끝판왕은 2009~2010년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주춤했다. 그리고 부활이 시작된 2011년 경부터 투심에 대한 언급이 간헐적으로 이어진다. 아마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 구종의 다양성을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
와중에 흥미로운 분석이 있었다. 선동열 전 삼성 감독의 얘기다. “(오)승환이는 변화구를 잘 던지기 어려운 투구폼을 가졌다.” 부드러움 보다는 다이나믹함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다. 따라서 포크볼, 체인지업, 커브 같은 브레이킹 볼보다는 투심이 편할 것이라고 계산했을 것이다.
대략 이 무렵부터였다. 매년 그의 투심에 관한 얘기들이 다뤄졌다. 여기에는 시기적으로 동일한 어떤 ‘패턴’이 존재한다. 2월 스프링 캠프 때만 한정해서 유통된다는 사실이다. 당사자의 인터뷰 또는 코치, 감독의 코멘트에서 나타난다. “작년에도 시즌 중에 간혹 써보긴 했어요. 올해는 더 연마해서 진짜 중요한 타이밍에 던질 수 있는 주무기로 만들려고요.”
그러나 실제로 시즌에 들어가서는 많이 던지지 않았다. 그동안은 주무기인 돌직구 하나면 충분했다. 슬라이더조차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시점이었다.
그러다가 요즘 들어 부쩍 활용도가 늘었다. fangraphs.com은 올 시즌 보스가 14개의 싱커를 던진 것으로 분류했다. 이들이 말하는 싱커란 곧 투심이다. 최고 구속은 93.2(포심 93.4)마일, 평균 91.1(포심91.2)마일이었다. 아직 이 공으로 안타를 허용한 적은 없었다.

이제는 완성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저스의 99번 투수나, 돌부처나 같다. 투심이 필요해진 이유는 구속 저하 탓이다. 힘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대안인 셈이다.
보스에게 투심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승부구로 던질 수 있는 공은 못된다는 뜻이다. 어제 경기에서도 그랬다. 초구 또는 0-1의 투수 카운트에서 구사됐다. 부담없는 타이밍에서 연마하는 단계로 봐야한다.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뽑아들 정도가 돼야 ‘주무기’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빠른 진화 과정을 거치느냐다. 몇 주 안에 될 수도 있다. 반면 몇 년 동안 연구와 실험만 하다가 끝낼 수도 있다. 다행히 아직은 좋은 진행인 것 같다.
투심의 목적은 단 하나다. 삼진을 잡기 위한 공이 아니다. 그라운드 볼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공 1개로 아웃 카운트를 잡을 수 있는 효율성이 최대의 장점이다.
“투심이 제대로 들어가서 땅볼로 잡을 때는 짜릿하더라구요. 삼진으로 아웃시키는 것보다 좋았어요.” 보스가 예전에 투심 찬양론을 펼 때 하던 말이다.
백종인 / 칼럼니스트 前 일간스포츠 야구팀장
'스포츠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출루의 달인' 추신수 앞의 전설들..루스·게릭·윌리엄스 (0) | 2018.07.11 |
|---|---|
| '亞 최장 연속출루' 추신수, 홈런 포함 2안타..텍사스는 연장패 (0) | 2018.07.05 |
| '세계랭킹 1위 탈환' 박인비, "개척한 선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일문일답) (0) | 2018.04.23 |
| LA 지역방송 극찬, "류현진이 실질적 다저스 2선발" (0) | 2018.04.23 |
| '배영수 136승' 한화이글스 단독 4위 (0) | 2018.04.20 |